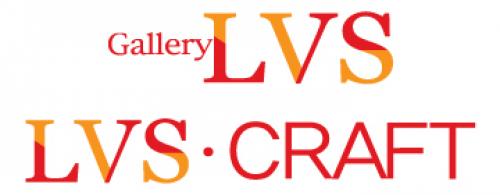45년째 벽돌을 만든다. 수작업이다. "미국 마이애미부터 멕시코 캉쿤, 국내 동해·남해·서해안까지 누비며 직접 모래를 채취한다. 요새는 한 달에 한 번 속초·고성·망상 쪽 해수욕장에서 두 자루씩 퍼온다. 투명한 데다 규사(硅砂)가 적절히 섞여 벽에 발랐을 때 제일 모래답게 보이더라."

화가 김강용(70)씨는 일종의 벽돌공이라 할 수 있다. 1976년부터 지금껏 오로지 벽돌만을 그려오고 있다. 체에 거른 모래를 접착제와 섞어 캔버스에 얇게 펴바르고, 붓으로 약간의 음영만 그려넣어 벽돌을 재현한다. 김씨는 "경제 발전기였던 당시엔 주변에 공사장과 벽돌 더미가 많았다"며 "다른 선배들이 포착하지 않은 주제와 표현 방식을 찾다 모래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의 벽돌 인생을 조명하는 회고전이 서울 성곡미술관에서 9월 20일까지 열린다. 반세기 화업을 아우르는 회화·설치작 190여 점이 놓여 있다.
모래로 그린 벽돌 그림, 그래서 흔히 극사실회화로 분류된다. 평면의 입체적 착시를 유도해 그림이 진짜 벽돌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씨는 "그림 속 벽돌은 모두 환영일 뿐 내 작업의 화두는 반복의 조형성"이라고 했다. "모래는 조형예술의 가장 원초적 요소인 점(點)을 상징한다. 모래 위에 선을 몇 개 그으면 면(벽돌)이 나타난다. 점·선·면이라는 회화의 본질과 관계된다."
제작 방식 탓에, 얼핏 공사판 미장처럼 보이기도 한다. "실제로 10년 전쯤 어깨가 너무 아파서 미장일만 30년 했다는 분에게 도움을 청한 적이 있다. 그런데 '지겨워서 못하겠다'더라. 흙손 자국 남지 않게 모래를 몇 시간씩 곱게 펴발라야 하는데, 몰입이 안 되면 못한다. 모래를 펴바르고 말리고 파내고 채우는 데만 한 달 이상 걸린다. 내가 오랜 세월 매달릴 수 있었던 건 희열 때문이다. 해변에서 모래를 퍼 담다가 군인들에게 검문도 여러 번 당했고, 5년 전엔 전시 참여차 들렀던 뉴칼레도니아에서 모래를 담아오다 공항에서 제지당해 간곡히 설득해 들여온 적도 있다. 이 과정 전체가 내 작업이다."
단색을 주로 해오다 2008년부터는 모래에 색을 섞어 여러 빛깔을 구현하고, 캔버스 대신 사각기둥에 벽돌을 그려넣는 등의 실험도 진행 중이다. 그림 속 모래 알갱이가 조명에 반사돼 반짝인다. 그는 그것이 "보석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출처 :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17/2020081700216.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